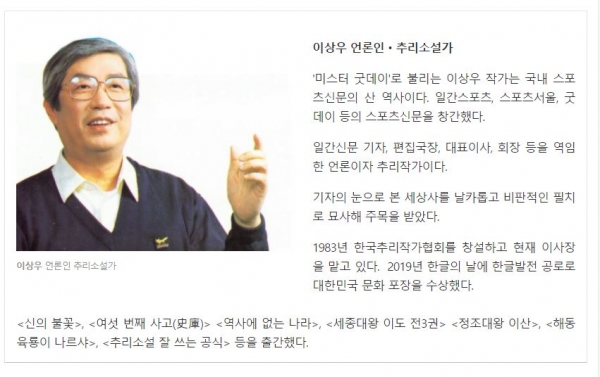유성우가 얘기해준 그날의 데이트만큼은 사실인 것 같았다.
유성우는 자유 로를 지나 판문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남산 하이야트 호텔 일식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일식집 특실은 꽤 비싸기는 하지만 데이트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나도 빨리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는 상상을 가끔 해봐요.”
한수지는 도미 회를 안주로 청주 몇 잔을 마시고는 몽롱한 눈으로 한강 건너 아파트촌의 가물가물한 불빛을 보며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엄마한테 허락을 받는 게 숙제야. 우리 결혼하면 수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꼭 직장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성우는 정겨운 눈길을 보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일생을 그냥 평범하고 행복에 겨워 보내는 그런 인생은 싫어요. 내가 연구한 분야의 성과를 꼭 이루고 싶어요.”
“콜. 그런 의미로 한 잔!”
유성우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저녁 한수지는 집에 가지 않았다.
호텔 VIP 룸에서 유성우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 커플의 첫날밤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의 세 남자 중에 제일 먼저 공주를 여왕으로 등극 시킨 것은 유성우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약혼자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한수지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겠네요?”
“나하고 첫날밤을 가진 뒤 이틀 만에 저세상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아, 실수, 내 실수야.”

호텔 VIP 룸에서 유성우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 커플의 첫날밤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의 세 남자 중에
제일 먼저 공주를 여왕으로 등극 시킨 것은
유성우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약혼자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한수지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었겠네요?”
“나하고 첫날밤을 가진 뒤 이틀 만에 저세상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약혼자의 죽음을 경찰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범인을 잡기 전에는 이 회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결심도 단단해 보였다.
“처음에 제가 한국 바이오 컴퍼니에 입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변하진 사장은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상당한 투자를 제의하자 겨우 찬성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약혼자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범인은 제 손으로 꼭 잡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는 보통 놈이 아니거든.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유성우와 두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러나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나는 유성우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한영지에게 연락했다.
“좋아요. 선생님. 오후 여섯 시에 ‘하늘을 우러러’ 보러 가요.”
나는 낮 동안에 곽정 형사한테 들러 수사 진행 사항을 알아보았다.
유성우는 사설 경호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 거짓말 한 것 아닌가 해서 테스트를 해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몇 초 이내에 경호원이 바람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경찰도 빨리 첨단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내가 곽정 형사와 헤어지고 세종문화 회관 뒤 윤동주의 벤치에 도착하니 한영지는 이미 와있었다.
“아니 아직 5분 전인데?”
“선생님은 늘 5분전에 오시잖아요.”
한영지가 방긋 웃었다.
분명히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콧날이며 눈매가 그렇게 반듯하며 매혹적일 수 없었다.
“선생님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저녁 사세요.”
한영지는 열려 있는 내 티셔츠 단추를 채워주며 말했다.
단추를 채울 때 내 코밑에 와 닿은 한영지의 머리에서는 향내 같은 머리 냄새가 났다.
환각적 이었다
“좋아, 어디로 갈까? 비싼 데도 괜찮아. 오늘 전자책 인세 좀 받았거든.”
“그거 손댔다가 사모님께 혼나는 것 아녜요?”
한영지가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사모님? 꼭 중요한 대목에서 초 치는 와이프가 나온다.
“남산 한옥마을까지 걸어가면 어때요? 가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요. 거기 가면 근처에 맛있는 냉면 집 있어요.”
한영지는 내가 바라던 말을 했다
내가 냉면 좋아한다는 것도 벌써 입력해두었다니 대견했다..
팔짱 낀 김에 좀 걷고 싶던 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