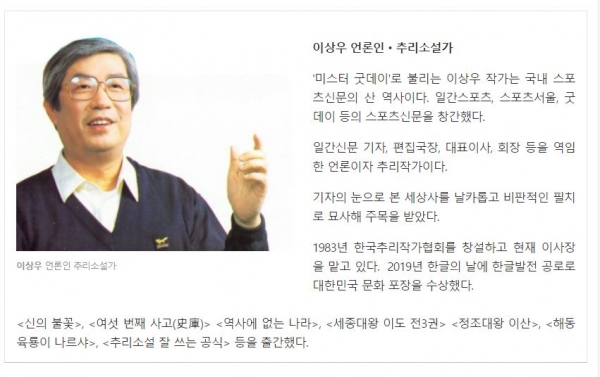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변 사장의 비밀 연구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으나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내가 자꾸 캐물으면 현유빈이 그 비밀 공간에서 변 사장과 무슨 짓을 했는가를 추궁한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 더 묻지 못했다.
나는 밀린 글을 써 잡지사에 보내느라고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다.
조금 한가해진 날 오후 한영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 한잔 콜?
- 콜.
금방 회답이 왔다.
- 지금 세종회관서 리허설 중. 5시 끝나요.
- 그럼 5시 30분에 별을 헤고 있을게.
나는 세종문화 회관 뒤 소공원의 윤동주 시가 있는 벤치로 갔다.
10분쯤 기다리자 한영지가 왔다.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되었네.”
“예, 선생님. 별 다 헤아렸어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었다.
“별을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기 때문이다.”
나도 시 구절로 대답했다.
우리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영지가 웃을 때는 언제나처럼 한쪽 뺨에만 있는 보조개가 쏙 들어가 귀여웠다.
터질듯이 착 달라붙는 청바지에 소매가 헐렁한 하얀 셔츠가 잘 어울렸다.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섹시하다고 해야 어울렸다.
우리는 도렴동 좁은 골목에 있는 오래된 카페에 들어갔다.
“생맥주가 어때요?”
한영지는 전에처럼 묻는 척 하고는 마음대로 생맥주 5백CC짜리 두 잔을 주문했다.
“저는 저녁 식사가 싫을 때는 맥주로 한 끼를 때워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럼 몸 상하지 않아? 뮤지컬 가수는 잘 먹어야 한대.”
그때였다.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민준이었다.
“아니, 여기 웬일로?”

나는 오붓한 데이트에 방해꾼이 나타나 저으기 당황했다.
“제가 오빠 오라고 했어요. 선생님 문자 오기 전에 오빠하고 약속이 있었거든요. 오빠, 여기 앉아.”
한영지는 오민준을 자기 곁에 바싹 붙어 앉도록 자리를 권했다.
좁은 카페라 모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만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내 앞에 딱 붙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나는 몹시 신경 쓰였다.
오민준이 우리 사이에 곱살이 낄 것이란 말을 미리 귀띔하지 않은 한영지가 야속하기까지 했다.
“유성우 본부장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나?”
나는 며칠 동안 잊고 있던 것을 물었다.
“미국 어디서 잘 놀고 있겠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민준이 예사롭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유성우가 미국에 있어?”
“원래 놀던 데가 거기니까 거기 갔을 거에요. 미안하니까 괜히 수수께끼 하나를 던지고 사라진 거죠.”
“그거 근거 있는 말인가?”
“근거나 뭐나 뻔해요. 걔는 제가 잘 알아요. 별난 애예요. 그런 짓 잘해요.”
나는 전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말이지?”
“예. 제 말 믿으세요.”
오민준은 태연하게 맥주 5백CC를 시켰다.
“나 화장실.”
나는 오민준의 말이 신경 쓰여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화장실 가는 척 하고 나와 곽정 형사한테 전화를 했다.
“유성우 소식 있어?”
“싱겁긴, 며칠 연락이 없더니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났어?”
곽정 형사는 핀잔부터 주었다.
“미국 놀러 간 것 아니야?”
“어어? 점점 이상해지네. 너 소설 쓰냐?”
“출근하기 껄끄러우니까 행방불명 자작 연출하고 본 바닥에 놀러간 것 아니냐고?”
“여병추 났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대단하다던 유성우 경호팀도 지금 혼비백산이야.”
“뭐? 정말이야? 경호팀을 만났어?”
나는 다음 날 곽정 형사와 만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막강한 유성우의 경호팀이 맥을 못 추었다면 바이오 킬러는 세계 최강의 암살자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