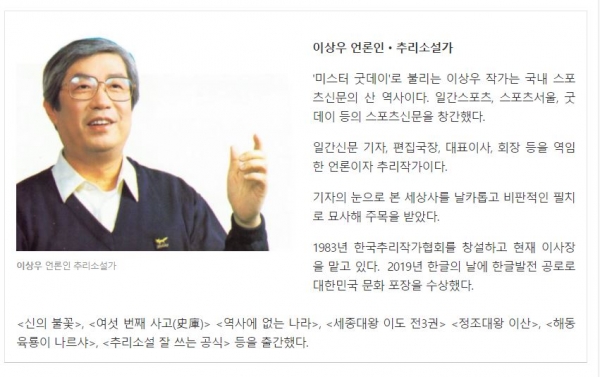이튿날 김종서는 우디거의 부하 십여 명을 거느리고 경원의 송희미 호군을 찾아갔다. 이미 양정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뒤라 송희미는 저자세를 취했다.
“김 우정언이 이 변경 골짜기에 와 있는 줄은 몰랐소. 고생이 얼마나 심하시오.”
송희미가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김종서는 한양에서 몇 번 부딪친 일이 있는 무관이었다. 생김새와는 달리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돌아앉아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비굴한 인물로 평이 나 있었다.
“송 호군이야말로 변경에서 고생이 많소.”
송희미는 김종서를 위로한답시고 술상까지 차려 놓았다. 술을 좋아하는 김종서지만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술 마실 처지가 아니었다.
“저야 원래 무반이라 이런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사다노에서 우리 아이들이 큰 실수를 했다던데... 모두 이 사람의 불찰이오. 용서하시오.”
송희미는 술을 따르면서 흘금흘금 김종서의 눈치를 보았다.
“양민을 겁탈하고 목숨을 빼앗은지라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오. 호군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시오?”
김종서가 아픈 곳을 먼저 찔렀다.
“우리 병사들이 워낙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인지라, 여인네 생각도 났겠지요. 군졸이 모자라 몇 년째 귀향 휴가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송희미는 우물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그렇지, 군사에게는 군율이 있고 사람에게는 인륜이 있는 법이오.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은 아니오.”
김종서가 단호하게 말하자 송 호군은 난처한 표정이 되었다.
“그렇기는 하오만... 양정이라는 젊은 패두는 장래가 촉망되는 무관이지요.자, 그 이야기가 급한 것이 아니니 우선 술이나 한 순배 하시지요. 얘들아, 이리 오너라.”
송 호군이 손뼉을 치자 관기 두 명이 들어와서 넙죽 절을 했다.
“옥매라고 하옵니다.”
“저는 구월이라고 하옵니다.”
두 여인이 요염하게 몸을 비틀며 큰절을 하고 앉았다.
김종서는 비위가 왈칵 상했다. 김종서는 술상을 주먹으로 치며 벌떡 일어섰다.
“아니, 왜 이러시오.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오? 다른 아이들로 부를까요?”
송희미 호군이 당황해서 김종서를 붙잡으며 계속 주절거렸다.
“나으리도 고향 떠난 지 꽤 되었는데 저녁에 여기서 저 아이들과 회포라도 풀고 천천히 가시지요.”
“이 일을 한양에 가서 전하께 상세히 보고하리다.”
김종서의 말에 송희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변경의 사소한 일까지 보고 하시다니요. 제가 군율로 즉각 다스릴 터이니 제발 참으시지요.”
김종서는 꼭 임금한테까지 고할 생각은 아니었다. 송 호군이 하는 짓이 괘씸해서 한 말이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려 주시오. 나는 한양 가서 좌군 체찰사께 보고하겠습니다.”
북방 변경 경비의 행정 업무는 좌군영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김종서는 경원에 와 있으면서 송희미 호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서 전해 들었다. 여자를 좋아해서 조선 사람이건 여진족이건 반반한 여자는 모두 수청을 들게 한다고 악명이 높았다. 그뿐 아니라 무인답지 않게 비겁해서 여진족 타르타르 두목한테 여러 번 공물을 보내면서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한양은 언제 가십니까?”
송희미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날 사다노에 갔던 지휘관은 군율로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서는 송희미의 질문을 무시하고 이 말만 남긴 채 휑하니 군영을 나섰다. 김종서는 양정의 처벌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뒤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실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보쇼. 우정언.”
송 호군이 뒤따라오며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김종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빠져 나왔다.
김종서가 학습소에 도착했을 때는 반달이 서쪽 하늘에서 졸고 있을 때였다. 학습소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홍득희와 홍석이도 여진족 아리들 틈에 섞여 자고 있었다.
그때였다.
‘딱!’
어디서인지 화살이 날아와 김종서의 허벅지에 꽂혔다.
“윽-”
김종서는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